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 사이에 많은 자연학자들이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갖가지 관찰과 실험을 했다. 보일의 진공 펌프 실험이나
라부아지에의 연소 실험은 후대에도 줄곧 이야기 될 내용이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사이에는 특히 빛, 열, 전기 및 기체의 성질이나 작용에 대한 온갖 관찰과 실험이 시도 되었고, 그 중 많은 내용이 출판되었다. 그 책들은 아직도 세계 여러 도서관의 고서 코너를 그득히 채우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여전히 현대에 출판되고 있는 책들과 섞여 공공 도서관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하지만 그 책들에 실려 있는 내용은 무의미한 관찰 또는 실패한 실험으로 잊혀 졌으며 역사학자들조차도 그 내용을 심각하게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그 많은 관찰과 실험 내용들이 현대 과학의 영역에서 사리지는 이유는 일견 명백해 보인다. 예를 들어 달의 운행과 지상의 기후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려 많은 사람들이 기상 기록을 남겼는데, 이런 노력을 계속해 볼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프리스틀리가 여섯 권의 책으로 남긴 기체의 성질에 대한 수백 가지 실험과 관찰 내용의 경우는 어떨까? 스팔란차니가 남긴 동물의 생리학적 실험들, 보네가 남긴 꿀벌의 생식과 생활에 관한 관찰과 실험들, 볼타가 남긴 전기 실험의 경우는? 아니, 그리고 보면 달의 위상 변화와 기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말 무의미 한 것일까?
이들 18세기 후반 저자들의 관찰과 실험 내용을 지루해 하며 건성건성 읽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과학사학자들이 장하석의 <온도계의 철학>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 책이 버려진 옛 관찰과 실험들 즉 잃어버린 탐구 프로그램이 철학적, 과학적으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철학도들 역시 이 책을 읽으며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을 경험했을 것이다. 여러 철학적 개념 도구들이 실제로 자연을 이해하고 과학의 작동 방식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간명하게 정리되어 요긴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자가 좀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 사실은 자신의 과학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탐구가 과학자체의 일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연 연구의 일부라는 점이다. 어떤 점에서 저자의 ‘역사적 과학철학’ 또는 ‘과학의 역사와 철학’ 프로그램이 한 걸음 떨어져서 과학을 분석하는 ‘메타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의 일부, 또는 저자의 겸허한 표현을 빌자면 ‘보완적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자신의 연구 활동이 과학의 일부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저자는 우선 현대 과학이 그 토대에 의문을 던지지 않는 온도 측정의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실 온도 측정의 역사는 수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조금씩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저자는 그 어려움이 조금씩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 보여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현대과학이 잃어버린, 또는 저버린 탐구 프로그램을 복원해 낸다. 그리고 그런 복원 작업이 일종의 과학 활동 즉 자연탐구 활동의 일부일 수 있음을 적시한다.
우리는 물의 어는점이 일정하며 끓는점 역시 고정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온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물의 어는점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끓는점이 일정하다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열량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온도를 측정하도록 온도계의 눈금을 만들 수 있을까?
수은 온도계로 빙점 이하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수은이 얼어 버리면 그 이하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했을까? 아니 그 자체가 얼어 버리는 수은으로 수은의 어는점을 측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계측용기가 녹아 버리는 고온은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인가?
저자는 위와 같은 질문들 중 어느 하나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 답을 얻기 위해 행해졌던 다양한 관찰과 실험 그리고 만들어졌던 질문이나 가설들 중 많은 내용이 자연의 이해를 위해 가치 있는 연구 프로그램임을 보여준다.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온도계는 18세기 전반 레오뮈르와 셀시우스의 온도계를 통해 신뢰할 만한 그리고 유용한 계측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은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진술에 담긴 허점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는 물의 끓는점이 과연 고정되어 있는지를 묻는 연구 프로그램은 활발히 작동하고 있었다.
장하석의 눈길을 가장 강렬하게 잡아 끈 학자는 당시 보네에서 소쉬르 그리고 픽테로 이어지는 일군의 자연학자들의 거주지였던 스위스 출신의 드 뤽이었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드 뤽은 물이 끓는다는 게 단순한 현상도 균일한 현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증기 거품들이 표면을 통해 솟아오르는 일반적인 끓음 현상은 열원에 따라 그 세기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온도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드 뤽은 보고했다. 하지만 상층부가 차가울 때는 바닥에서 솟아오르던 증기 거품이 쉿 소리를 내며 표면에 이르기 전에 다시 액체 상태로 변했다.
드 뤽은 그 밖에도 물이 끓는다는 관찰 아래에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간혹 커다란 증기 거품이 불안정하게 솟아오르는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요동치는 끓음이 아주 심해져 폭발적으로 용기의 물을 분출해 내는 상황도 관찰되었다. 사실은 끓는 점 아래에서도 거품이 없이 중기와 열이 꾸준히 표면을 통해 빠져 나가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용해되어 있는 공기가 표면을 통해 방출되는 현상도 어찌 보면 끓음의 일종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진정한 끓음이란 어떤 현상이란 말인가? 그게 분명치 않다면 어떻게 물의 끓는점을 온도 측정의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드 뤽은 여러 날에 걸쳐 물이 든 용기를 흔들어 수용 기체를 날려 보낸 순수한 물은 고정된 끓는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얻지는 못했다.
19세기로 이어지면서 물이 끓는다는 현상은 점차 더 복잡한 현상들로 분화되어 이해되기 시작했다. 유리가 아닌 금속 용기로 물을 끓일 경우에도 끓는점은 같을까? 물속에 유리가루나 쇳조각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된 질문들은 19세기 중반까지 여러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프로그램이었으며, 의미 있는 자연탐구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는 왜 계속되지 않았을까? 저자는 당시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제기 되었던 많은 질문들 중 일부는 현대의 과학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현대 과학은 그런 질문을 거두었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왜 그 질문을 거두었는가? 일찌기 토머스 쿤은 자연과학은 이전의 연구 결과들에 의문을 던지지 않고 연구의 초점을 좁혀가며 분야 특유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진보와 창의적인 혁신을 이루어 가는 활동임을 보여 주었다. 쿤에게 드 뤽이나 프리스틀리의 관찰이나 실험은 사실 과학이라기보다는 전과학 단계의 방향 없는, 즉 생산성 없는 활동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쿤이 그려 보여 준 전문분야 과학자들의 협애한 연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비전문가나 인접 분야학자들 또는 복원된 과거 학자들의 연구 기획에서도 전문 분야 과학자들이 묻지 않는 질문, 행하지 않는 연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또 새로운 이해에 이를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과학의 진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과학 역시 그러하리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사이에는 특히 빛, 열, 전기 및 기체의 성질이나 작용에 대한 온갖 관찰과 실험이 시도 되었고, 그 중 많은 내용이 출판되었다. 그 책들은 아직도 세계 여러 도서관의 고서 코너를 그득히 채우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여전히 현대에 출판되고 있는 책들과 섞여 공공 도서관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하지만 그 책들에 실려 있는 내용은 무의미한 관찰 또는 실패한 실험으로 잊혀 졌으며 역사학자들조차도 그 내용을 심각하게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그 많은 관찰과 실험 내용들이 현대 과학의 영역에서 사리지는 이유는 일견 명백해 보인다. 예를 들어 달의 운행과 지상의 기후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려 많은 사람들이 기상 기록을 남겼는데, 이런 노력을 계속해 볼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프리스틀리가 여섯 권의 책으로 남긴 기체의 성질에 대한 수백 가지 실험과 관찰 내용의 경우는 어떨까? 스팔란차니가 남긴 동물의 생리학적 실험들, 보네가 남긴 꿀벌의 생식과 생활에 관한 관찰과 실험들, 볼타가 남긴 전기 실험의 경우는? 아니, 그리고 보면 달의 위상 변화와 기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말 무의미 한 것일까?
이들 18세기 후반 저자들의 관찰과 실험 내용을 지루해 하며 건성건성 읽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과학사학자들이 장하석의 <온도계의 철학>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 책이 버려진 옛 관찰과 실험들 즉 잃어버린 탐구 프로그램이 철학적, 과학적으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철학도들 역시 이 책을 읽으며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을 경험했을 것이다. 여러 철학적 개념 도구들이 실제로 자연을 이해하고 과학의 작동 방식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간명하게 정리되어 요긴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자가 좀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 사실은 자신의 과학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탐구가 과학자체의 일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연 연구의 일부라는 점이다. 어떤 점에서 저자의 ‘역사적 과학철학’ 또는 ‘과학의 역사와 철학’ 프로그램이 한 걸음 떨어져서 과학을 분석하는 ‘메타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의 일부, 또는 저자의 겸허한 표현을 빌자면 ‘보완적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자신의 연구 활동이 과학의 일부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저자는 우선 현대 과학이 그 토대에 의문을 던지지 않는 온도 측정의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실 온도 측정의 역사는 수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조금씩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저자는 그 어려움이 조금씩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 보여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현대과학이 잃어버린, 또는 저버린 탐구 프로그램을 복원해 낸다. 그리고 그런 복원 작업이 일종의 과학 활동 즉 자연탐구 활동의 일부일 수 있음을 적시한다.
우리는 물의 어는점이 일정하며 끓는점 역시 고정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온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물의 어는점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끓는점이 일정하다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열량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온도를 측정하도록 온도계의 눈금을 만들 수 있을까?
수은 온도계로 빙점 이하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수은이 얼어 버리면 그 이하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했을까? 아니 그 자체가 얼어 버리는 수은으로 수은의 어는점을 측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계측용기가 녹아 버리는 고온은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인가?
저자는 위와 같은 질문들 중 어느 하나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 답을 얻기 위해 행해졌던 다양한 관찰과 실험 그리고 만들어졌던 질문이나 가설들 중 많은 내용이 자연의 이해를 위해 가치 있는 연구 프로그램임을 보여준다.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온도계는 18세기 전반 레오뮈르와 셀시우스의 온도계를 통해 신뢰할 만한 그리고 유용한 계측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은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진술에 담긴 허점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는 물의 끓는점이 과연 고정되어 있는지를 묻는 연구 프로그램은 활발히 작동하고 있었다.
장하석의 눈길을 가장 강렬하게 잡아 끈 학자는 당시 보네에서 소쉬르 그리고 픽테로 이어지는 일군의 자연학자들의 거주지였던 스위스 출신의 드 뤽이었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드 뤽은 물이 끓는다는 게 단순한 현상도 균일한 현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증기 거품들이 표면을 통해 솟아오르는 일반적인 끓음 현상은 열원에 따라 그 세기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온도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드 뤽은 보고했다. 하지만 상층부가 차가울 때는 바닥에서 솟아오르던 증기 거품이 쉿 소리를 내며 표면에 이르기 전에 다시 액체 상태로 변했다.
드 뤽은 그 밖에도 물이 끓는다는 관찰 아래에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간혹 커다란 증기 거품이 불안정하게 솟아오르는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요동치는 끓음이 아주 심해져 폭발적으로 용기의 물을 분출해 내는 상황도 관찰되었다. 사실은 끓는 점 아래에서도 거품이 없이 중기와 열이 꾸준히 표면을 통해 빠져 나가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용해되어 있는 공기가 표면을 통해 방출되는 현상도 어찌 보면 끓음의 일종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진정한 끓음이란 어떤 현상이란 말인가? 그게 분명치 않다면 어떻게 물의 끓는점을 온도 측정의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드 뤽은 여러 날에 걸쳐 물이 든 용기를 흔들어 수용 기체를 날려 보낸 순수한 물은 고정된 끓는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얻지는 못했다.
19세기로 이어지면서 물이 끓는다는 현상은 점차 더 복잡한 현상들로 분화되어 이해되기 시작했다. 유리가 아닌 금속 용기로 물을 끓일 경우에도 끓는점은 같을까? 물속에 유리가루나 쇳조각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된 질문들은 19세기 중반까지 여러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프로그램이었으며, 의미 있는 자연탐구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는 왜 계속되지 않았을까? 저자는 당시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제기 되었던 많은 질문들 중 일부는 현대의 과학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현대 과학은 그런 질문을 거두었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왜 그 질문을 거두었는가? 일찌기 토머스 쿤은 자연과학은 이전의 연구 결과들에 의문을 던지지 않고 연구의 초점을 좁혀가며 분야 특유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진보와 창의적인 혁신을 이루어 가는 활동임을 보여 주었다. 쿤에게 드 뤽이나 프리스틀리의 관찰이나 실험은 사실 과학이라기보다는 전과학 단계의 방향 없는, 즉 생산성 없는 활동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쿤이 그려 보여 준 전문분야 과학자들의 협애한 연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비전문가나 인접 분야학자들 또는 복원된 과거 학자들의 연구 기획에서도 전문 분야 과학자들이 묻지 않는 질문, 행하지 않는 연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또 새로운 이해에 이를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과학의 진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과학 역시 그러하리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 Science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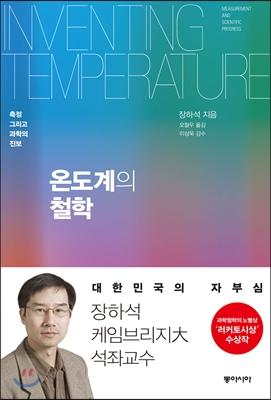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