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부담, 분납·장학금으로 줄일 수 있어
현지서도 한국인끼리 어울리는 풍토 유감
유학 지망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아이비리그 입학을 꿈꾼다. 아이비리그는 다트머스·브라운·예일·컬럼비아·코넬·펜실베이니아·프린스턴·하버드 등 미국 동부 지역 소재 8개 명문 사립대학을 총칭하는 말. 하지만 막상 비싼 학비나 자녀의 현지 적응 여부 등을 생각하면 결정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실제 아이비리그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인의 사례를 취재했다(솔직한 얘길 듣기 위해 취재원은 모두 익명 처리했다).
이런 점 좋더라ㅣ장학금 혜택 다양… 강의 수준 만족도 높아
자녀의 아이비리그 진학을 고려할 때 가장 저어되는 게 학비(연간 평균 7000만원 선) 부담이다. A씨는 "아이 동문 학부모 모임에 나가보면 '집 팔아 자식 공부시켰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움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B씨는 아들 학비를 분납(分納) 방식으로 지불해 목돈 지출을 피했다. 딸의 학비는 외부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그는 "생각보다 장학생 심사 과정이 복잡했다"고 말했다. "장학생 심사는 세 차례에 걸친 면접으로 진행됐어요. 특히 첫 번째 면접의 경우 심사관이 학교로 직접 면접을 나와 아이와 다섯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어요. 질문 내용도 초등 시절부터 교우 관계까지 딸의 면면을 속속들이 들춰보는 식이라 아주 구체적이었고요."
강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A씨는 "컬럼비아대의 경우, 소수정예식 수업을 위해 교양 과목을 비롯한 전 강의 수강 정원이 20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수험 기간 내내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 진학 준비생과 달리 비교과 활동의 폭이 넓은 점도 학부모 입장에선 안심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미국 대학 입시에선 비교과 활동 내역이 주요 평가 요소다.) "딸은 고교생 시절 관심 분야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전문가를 찾아 나섰어요. 돌아보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돌아다녔던 그때가 무척 보람찼습니다."(C씨)
이런 점 아쉽다ㅣ현지서도 '끼리끼리'… 입학 경쟁 이상 과열
아들과 딸을 각각 미국 보딩스쿨과 국내 고교에 진학시킨 B씨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대학 입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편하게 입시를 치른 아들과 달리 딸은 고 2 무렵 하루 2시간씩 자며 공부에 매달렸는데도 AP(선이수학점제) 코스를 7개 과목밖에 이수하지 못했어요. 교외 활동이라고 해야 탈북자 자녀 대상 영어교육 봉사가 전부였고요. 당시 '그것밖에 안 시키고 불안하지 않으냐'는 주변 엄마들 얘길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스펙 가짓수'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다. B씨는 "종종 동아리명만 올려놓고 '유령 회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 경우 대체로 입시 결과가 나쁘더라"며 "아이비리그를 공략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추천서 내용 간 일관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시용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찮다. D씨는 "아이가 다니던 고교에 AP 수업이 없어 월 140만원짜리 AP 대비 과외를 시켰고 SAT도 여러 차례 치르게 했다"며 "원서 제출 직전 2270점(2400점 만점)을 받아놓고도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불안하더라"고 말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해외 유학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더없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취재에 응한 학부모는 "막상 아이들이 어울리는 무리는 현지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더라"며 아쉬워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내 한인 그룹은 크게 △국내파(외국어고·국제고 출신) △조기유학파(보딩스쿨 출신) △교포파 등 세 부류로 나뉜다. 출신 배경이 같거나 비슷한 동기와 '끼리끼리' 친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A씨는 "학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 교우 관계에서까지 (현지인과 친해져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인터뷰 참가자
A(50·서울 종로구)ㅣ아들 컬럼비아대(1년) 재학 중
B(50·서울 서초구)ㅣ아들 코넬대(2년) 휴학 중, 딸 프린스턴대(1년) 재학 중
C(56·서울 강남구)ㅣ딸 하버드대(1년) 재학 중
D(46·경기 성남시 분당구)ㅣ아들 펜실베이니아대(1년) 재학 중
이런 점 좋더라ㅣ장학금 혜택 다양… 강의 수준 만족도 높아
자녀의 아이비리그 진학을 고려할 때 가장 저어되는 게 학비(연간 평균 7000만원 선) 부담이다. A씨는 "아이 동문 학부모 모임에 나가보면 '집 팔아 자식 공부시켰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움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B씨는 아들 학비를 분납(分納) 방식으로 지불해 목돈 지출을 피했다. 딸의 학비는 외부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그는 "생각보다 장학생 심사 과정이 복잡했다"고 말했다. "장학생 심사는 세 차례에 걸친 면접으로 진행됐어요. 특히 첫 번째 면접의 경우 심사관이 학교로 직접 면접을 나와 아이와 다섯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어요. 질문 내용도 초등 시절부터 교우 관계까지 딸의 면면을 속속들이 들춰보는 식이라 아주 구체적이었고요."
강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A씨는 "컬럼비아대의 경우, 소수정예식 수업을 위해 교양 과목을 비롯한 전 강의 수강 정원이 20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수험 기간 내내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 진학 준비생과 달리 비교과 활동의 폭이 넓은 점도 학부모 입장에선 안심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미국 대학 입시에선 비교과 활동 내역이 주요 평가 요소다.) "딸은 고교생 시절 관심 분야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전문가를 찾아 나섰어요. 돌아보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돌아다녔던 그때가 무척 보람찼습니다."(C씨)
이런 점 아쉽다ㅣ현지서도 '끼리끼리'… 입학 경쟁 이상 과열
아들과 딸을 각각 미국 보딩스쿨과 국내 고교에 진학시킨 B씨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대학 입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편하게 입시를 치른 아들과 달리 딸은 고 2 무렵 하루 2시간씩 자며 공부에 매달렸는데도 AP(선이수학점제) 코스를 7개 과목밖에 이수하지 못했어요. 교외 활동이라고 해야 탈북자 자녀 대상 영어교육 봉사가 전부였고요. 당시 '그것밖에 안 시키고 불안하지 않으냐'는 주변 엄마들 얘길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스펙 가짓수'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다. B씨는 "종종 동아리명만 올려놓고 '유령 회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 경우 대체로 입시 결과가 나쁘더라"며 "아이비리그를 공략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추천서 내용 간 일관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시용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찮다. D씨는 "아이가 다니던 고교에 AP 수업이 없어 월 140만원짜리 AP 대비 과외를 시켰고 SAT도 여러 차례 치르게 했다"며 "원서 제출 직전 2270점(2400점 만점)을 받아놓고도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불안하더라"고 말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해외 유학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더없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취재에 응한 학부모는 "막상 아이들이 어울리는 무리는 현지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더라"며 아쉬워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내 한인 그룹은 크게 △국내파(외국어고·국제고 출신) △조기유학파(보딩스쿨 출신) △교포파 등 세 부류로 나뉜다. 출신 배경이 같거나 비슷한 동기와 '끼리끼리' 친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A씨는 "학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 교우 관계에서까지 (현지인과 친해져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인터뷰 참가자
A(50·서울 종로구)ㅣ아들 컬럼비아대(1년) 재학 중
B(50·서울 서초구)ㅣ아들 코넬대(2년) 휴학 중, 딸 프린스턴대(1년) 재학 중
C(56·서울 강남구)ㅣ딸 하버드대(1년) 재학 중
D(46·경기 성남시 분당구)ㅣ아들 펜실베이니아대(1년) 재학 중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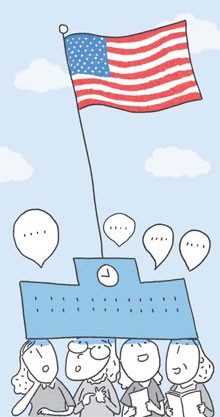
댓글 없음:
댓글 쓰기